[뉴스워치= 칼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이란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한다. 난민(refugee)은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하고자 망명한 칼뱅주의자인 위그노를 ‘refugié’라 부른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지난 6월 16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가 지난달 기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해 말 8천930만 명에서 5개월 새 12%나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피란민의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약 59.6%인 5천320만 명은 모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고,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2천710만 명이라고 한다. UNHCR은 강제이주민의 수는 세계 인구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식량부족과 기아,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터키로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난민의 수용에 대하여는 찬반이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2%에 불과하였다.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이 평균 38%임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적은 비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이었다. 유엔난민기구가 조사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의 각국 난민 인정률에 따르면 한국은 1.3%로 최하위에 속한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했던 지난 정권 시기인 최근 3년간 난민인정율은 2019년 1.6%, 2020년 1.1%, 2021년 1.0%였다. 또한, 한국은 '인도적 체류'와 '난민'을 구분하는데, 대부분 ‘난민’ 대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1만 2천 169건으로, 심사관 1인당 135건을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은 단지 심사를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난민심사에서 탈락하여 진행 중인 불복소송 건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불어난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심사해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난민심사도 문제가 있다. 몇 년 전에는 법무부의 난민 조작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가 면접 중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박해 사실이 조서에 기록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혀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1차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2차 심사를 담당하고 난민조사관은 모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다. 상급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국가와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할 뿐 대부분은 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일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난민심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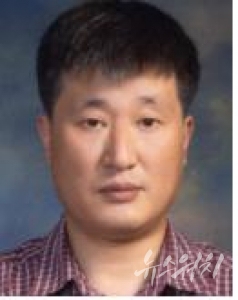
난민은 힘들다. 한국에서의 난민은 더욱 고달프다. 영국 카디프대학 교수인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은 6월 20일에 인간은 1년 중 가장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고 했다. 부디 난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난민의 날이 되길 바란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